> 기획
<인천문화통신 3.0> 2022년 11월호는 <100호 발간 기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천문화통신은 2007년에 시작하여 2016년 3월에 3.0 버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100호 기획특집에는 2016년부터 함께 해 주신 이재은 소설가님의 원고를 통해
인천문화통신이 앞으로 발전할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천문화통신 3.0>은 인천의 문화예술현장의 소식과 정보를 시민 여러분께 전달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읽는 인천문화통신 말고
이재은 (소설가)
부담스러운 청탁을 받았다. 나는 ‘<인천문화통신 3.0> 100호 발간 기획특집’ 같은 자리에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아니라고 말도 못 했다. 나보다 잘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 거절도 못 했다. 일거리가 있으면 미리미리 해두는 편인데 이번 원고는 도통 준비가 안 됐다. 닥치면 하게 될까, 마감은 지켜야 할 텐데, 불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 글을, 다시 이렇게 시작해도 될까?
<인천문화통신 3.0>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2016년 <인천문화통신 3.0>이 탄생할 때 필진으로 참여했다. ‘큐레이션 콕콕’을 맡았는데 문화 키워드 중 하나를 선정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알려줄게요, 하며 말을 거는 일이었다. 도깨비 이야기로 문을 열었고, 플리마켓과 1인의 세계, 독립출판과 서점의 시대, 여름의 감염병, 대통령의 여름 독서 등을 다뤘다. 기부는 힘이 세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오, 나의 굿즈!로 감탄을 내뱉으며 관심을 구하기도 했다. (돌아온 피드백이 거의 없었으니) 2주에 한 번 독백하는 식으로 연재했는데, ‘일상과 명상’으로 라임을 맞추거나 ‘미세한 먼지들’처럼 익숙한 단어를 살짝 변형하며 혼자 쿡쿡 웃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원고 청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3년이나 ‘큐레이션 콕콕’을 실었던 탓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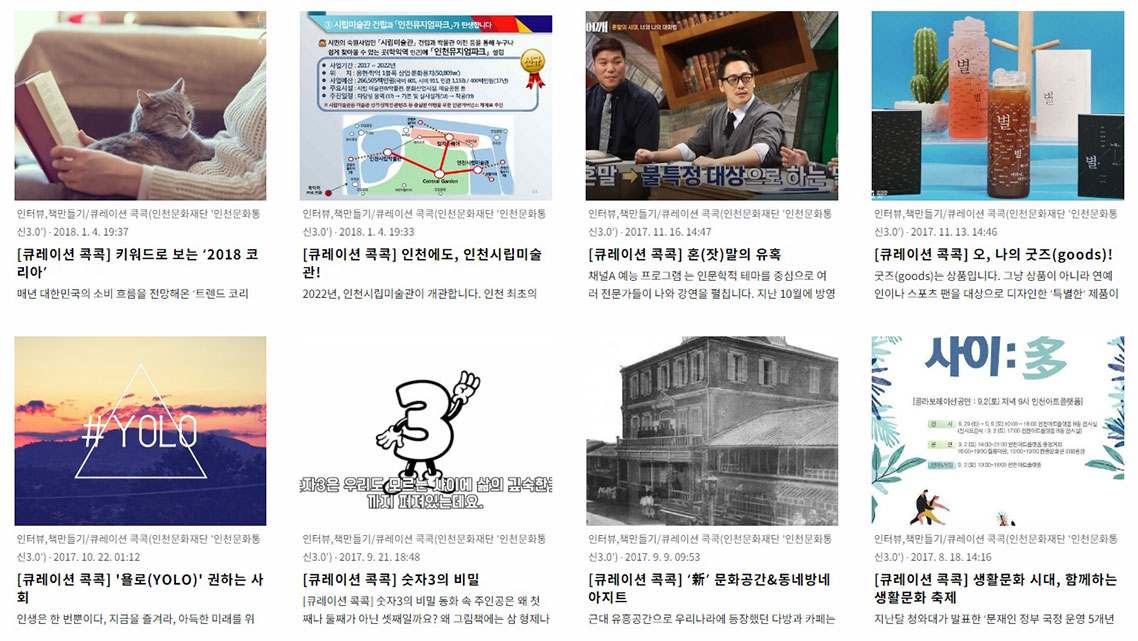
큐레이션 콕콕
처음에는 눈치를 봤다. 요즘 뭐가 핫하지? 뭐가 재미있지? 뭐가 인기 있지? 눈치 보는 일에는 ‘남’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의 내 감정은 막연했다. 잘하고 싶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다. 그즈음 눈 밝은 누군가가 내게 말했다. “네 색깔을 찾아.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내가 원하는 걸 하라고? 그래도 되나? 내가 그만한 감각과 시선을 갖고 있나? 그분의 말씀에 조금 용기를 냈던 것 같다. 내 자리가 나다운 자리야, 나다운 것이 우리다운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 아닐까? 그렇게 ‘요즘 편의점’도 쓰고, ‘K문학’도 쓰고, ‘인천의 술’도 쓰고 내 맘대로……
내 글이 실리던 시기에는 <인천문화통신 3.0>을 열심히 봤다. 어떤 글이 메인에 배치됐는지 궁금해서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다른 글도 꼬리 잡기 하듯 읽어나갔다. 내 글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열성 독자가 되기 힘들었다. 메일이 오면 관심 있는 꼭지만 몇 개 클릭해 읽는 식이었다. 오랜만에 <인천문화통신 3.0>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상단에 기획, 인물, 리뷰, 칼럼, 현장, 문화정책, 행사소식 등의 카테고리가 있다.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았다. 이주에, 이달에, 이 계절에, 올해에, 이 시대에 남기지 않으면 안 될 이야기, 보고 느끼지 않으면 안 될 문화예술과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담겨 있었다. 주목받았고, 주목받을 것이며, 주목받지 않으면 안 될 소식들이 가벼운 스케치와 깊이 있는 전문가의 목소리로 정리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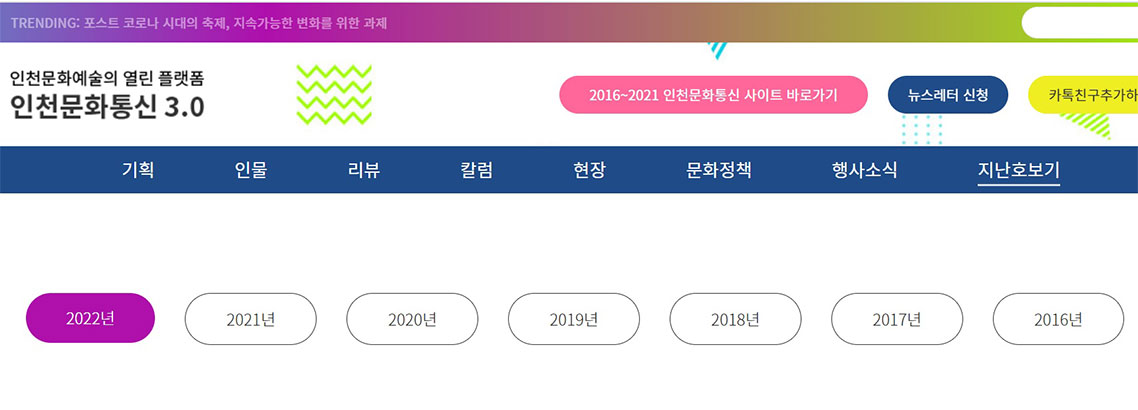
<인천문화통신 3.0> 메뉴
메뉴 분류를 보며 생각했다. 나에게 가장 흥미로운 코너는 뭘까. 기획? 아니. 칼럼? 글쎄. 보지 못한 공연이나 전시 리뷰는 생각이 겉 돌게 뻔하고, 문화정책은 흐음… 아무래도 인물과 현장이 끌렸다. 인물, 또는 현장이라는 단어에서 사연과 사건, 이벤트를 연상한 걸까. 새로운 것을 알고 싶다는 욕망과 남다른 것을 발견하고 싶다는 욕심이 꿈틀댔다. 클릭하고, 스크롤을 내리고, 다시 클릭 클릭. 바람과 호기심이 있었음에도 나는 좀처럼 모든 기사에 집중하지 못했다. SNS에서 본 것 같았고, 너무 먼 데 있는 사람의 고백 같았다. 딱딱하고 아득한 정보가 많다는 인상. 다 알아야 할까? 다 보고 듣고 이해해야 할까?
개구쟁이 같은 제안. 작금에 어울리는 현실적인 기록도 좋지만, 오늘의 화제에서 벗어난 이슈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이를테면 ‘지금 말하고 싶은 옛날 것’을 공유한다든지. 전문가의 글이 아닌 독자들이 자신의 사유와 감상을 펼쳐놓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필력 좋은 숨은 고수를 찾는 게 어렵다면 응모를 받아 글을 선별한 뒤에 고료를 주는 방식은 어떨까?
경력과 작품 위주로 소개하는 예술인 코너에 ‘요즘에 즐거웠던 일’ 섹션을 넣으면 어떨까? 정책이나 비평 같은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 말고 소프트 에세이처럼 가벼운 글로 <인천문화통신 3.0>을 꾸미면 안 될까? 소성주에 얽힌 이야기를 실어도 되고, 월미도에 관한 추억도 근사할 것 같은데. 너무 인천, 인천 하면 지역적으로 한계짓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술이나 바다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함께 소개해서 시야를 넓히는 건 어떤지. 더불어 살기, 돌봄 같은 소재는? 소외와 가난 같은 핵심어는? <인천문화통신 3.0>이 아는 사람만 아는, 끼리끼리 읽는 통신 말고 함께 읽는 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에 즐거웠던 일
(사진 출처: 픽사베이)
최근에 읽은 소설 이야기. 한 번도 메달을 따지 못한 열아홉 역도부 여학생의 기록은 반년 넘게 96 킬로그램에 멈춰 있다. 그녀의 목표는 100 킬로그램 바벨을 드는 것. 친구가 묻는다. 왜 100이야? 잠시 후 여학생의 대답. “그것은 세 자리고, 100은 100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100퍼센트의 100 말이야…….”
100호 이후의 <인천문화통신 3.0>을 응원하고 기대한다.

이재은 (李在恩 Lee Jae Eun)
소설가. 마음만만연구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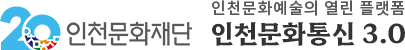
how to take priligy Miller KD, Althouse SK, Nabell L, Rugo H, Carey L, Kimmick G, Jones DR, Merino MJ, Steeg PS
The light induced increase persisted for more than 90 min and returned to baseline over the course of 2 h where can i get cytotec without prescription viagra pomada tacrolimus valor It is some 10 days now since a senior policeman giving evidence to the inquiry, Lt Col Duncan Scott discussing evidence that he d brought in on his own computer hard drive almost casually agreed to hand it over to the commission s lawyers
haloperidol and apomorphine both increase QTc interval strep throat augment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