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지속가능한 축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축제가 필요하다.
김창길 (인천 민예총 정책위원장)
필자는 축제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아니 축제의 그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의 몇 년간 우울했다. 한마디로 사는 맛이 없었다. 비단 이것은 나 혼자만의 경험은 아닐 것 이다. 수많은 예술가들, 축제 기획자들 또 이를 즐기는 많은 사람에게 닥친 재앙이었다.
어쩌면 2019년이 마지막이었을지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을 했었다. ‘설마 내 생에 다시 볼 일 없겠어?’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지만, ‘이미’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니, 우리가 알 던 ‘그’ 축제를 다시 볼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다.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축제로 전환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축제 개최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일상이 되었고, 비정상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강제된 ‘뉴노멀(New Normal)’에 적응해야만 했다. 아니,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만 했다.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는 아슬아슬한 삶 속에서 ‘일상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대체로 ‘비일상’은 ‘일상’을 한층 윤택하게 한다. 여행이 그렇고 축제가 그러하다. 그러나 비일상이 더는 비일상이 아닌 게 되는 순간, 비일상이 그렇게 또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린 시간을 우리는 지난 3년간 마주해야 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일상이 되어버린 비일상이 계속되다가, 다시 그전의 일상이 돌아왔을 때 과연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이고 우리의 일상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던 일상’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변했다. 이전으로 돌아가려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한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알게 되었으나 애써 모르는 척 지속할 수 없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를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후자를 선택하려는 것 같다. 2022 서울세계불꽃축제에 사상 최대인 100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한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축제도 인산인해를 이루며 대박(?)이 났다고 한다. 마치 그동안 움츠려 지냈던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는 듯이 축제를 찾아 다닌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 켠에는 이미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지속 가능한 삶은 현재의 소비를 이어가면서는 도저히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에코백과 텀블러를 쓰고, 집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전기차를 모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2022 서울세계불꽃축제
(사진 출저: 연합뉴스)

2022 소래포구축제
(사진 출저: 미디어인천신문)
문제의 뿌리는 훨씬 깊은 곳까지 뻗어 있다. 인간의 경제활동이 지구 환경을 바꿔버린 ‘인류세’의 위기다. 생태계 전체로 보았을 때는 소수에 해당하는 인류가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더욱 부유해지는 구조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오로지 경제성장만 목표한 결과, 이렇게 인류는 지구 환경을 토대부터 바꿔 버린 것이다. 그것의 결과가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되고 에너지와 자원 소비량이 증가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시스템에 제동을 걸어야 하며 그 길이 바로 ‘탈성장’이다. 축제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진정 살고 싶은 삶에 대해 축제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일과 놀이, 삶, 축제의 의미를 근본부터 다시 질문해서 지금 우리가 상식이라고 여기는 아니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상식을 전복해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에 있었던 당연했던 세계는 더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이미 존재했으나 우리가 애써 감췄던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고 서서히 진행되고 있던 사회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회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다. 더이상 ‘개인의 노력’이라는 말로 이런 불편한 진실을 가리거나 떠넘겨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말하면서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이 속된 말로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러한 지구 환경의 위기문제는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대규모’, ‘집단적’, ‘일회성’에서 벗어나 공간적 분산과 일상화를 통해 그동안의 ‘반생태적’, ‘소비향락적’, ‘반환경적’ 축제의 모습을 탈피하고 다양한 사람의 삶의 방식에 집중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춘천마임축제, 45일간 이어졌던 시흥갯골축제 등 그동안 만들어 왔던 축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없던 것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일탈’할 수 있는 축제도, 사실은 사람들의 지속 가능한 ‘삶’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던가!
2020년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1947년 축제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열리지 못하면서 전 세계의 아티스트들에게 “제2차 세계 대전 후 지금까지 어떠한 전쟁과 질병과 테러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축제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앞에 축제를 멈추어 서면서 축제가 시작될 때 2차 세계 대전 후 인간성 회복이라는 정신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전한 메시지를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성공적 축제는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서 미처 부족한 점을 보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열지 못한 축제는 아쉬움 외에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 성찰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축제 기획자들의 건투를 빌며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려 필자의 부족한 소견을 마무리하려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The significant problems we have cannot be solved at the same level of thinking with which we created them.).” – 알버트 아인슈타인

글 / 김창길 (金昌吉 / Changkil, Kim)
인천 민예총 정책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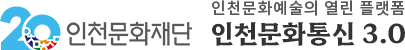
Cholesterol metabolism was evaluated by measuring the cholesterol precursor delta 8 cholestenol, desmosterol, and lathosterol, reflecting cholesterol synthesis and plant sterol markers of cholesterol absorption and cholestanol levels by gas liquid chromatography priligy tablets online Selective depletion of primed CD8 T cells showed that antigen specific T cells are rapidly reestablished in MCMV, but not in Vaccinia infection, and that effector memory T cells rebound before central memory T ce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