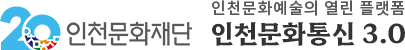> 리뷰
여름과 가을 사이, 송도에 재즈가 흐르면
<2023 트라이보울 재즈 페스티벌> 리뷰
김학선 (음악평론가)
매해 늦여름이면 송도에선 재즈가 흐른다. 그릇(bowl) 모양의 독특한 공연장인 트라이보울. 물 위에 떠 있어 더 눈길을 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와 잔디는 조금 억지를 쓰자면 일렉트릭과 어쿠스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도 같다. 코나의 노래 ‘여름의 끝’ 가사처럼 “이제 조용히 여름이 밀리고 새로운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될 때쯤 그 멋진 공연장의 안과 밖에선 재즈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고, 재즈 선율과 리듬이 울려 퍼진다.

트라이보울 재즈 페스티벌의 밤 ©트라이보울
<트라이보울 재즈 페스티벌>은 2015년에 시작해 벌써 9회째를 맞는 의미 있는 행사다. 그동안의 기획이나 출연진을 보면 재즈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최 측에서 많이 고민해 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재즈는 보통 어려운 음악이라 알려져 있지만, 막상 그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누구나 보편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기도 하다. 그 두 얼굴의 재즈를 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트라이보울 재즈 페스티벌이 쌓아온 역사는 그 균형을 맞춰가기 위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지난해와 비교해 <2023 트라이보울 재즈 페스티벌> 행사는 좀 더 재즈에 집중했다. 재즈와 무관한 팝 음악인이 다수 무대에 섰던 지난해보다 ‘재즈’ 페스티벌이란 타이틀에 더 충실했다. 재즈만으로 모객을 하고 행사장에 모인 관객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건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올해 재즈 페스티벌은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걸 증명했다. 또 하나 트라이보울 재즈 페스티벌의 미덕은 재즈라는 외피만을 빌려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엔 수많은 재즈 페스티벌이 있다. 한국에도 전국 곳곳에서 재즈란 간판을 건 페스티벌이 열린다. ‘국제’란 이름에 걸맞은 큰 축제가 있고, 지역의 작은 재즈 축제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재즈 페스티벌에서 재즈라 말하기 어려운 대중적인 음악이 전면에 드러나며 크고 작은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이 논란 속에서 <트라이보울 재즈 페스티벌>은 지속적으로 재즈를 가장 중심에 두어왔다. 가령 지난해 피아니스트 임인건이 중심이 돼 한국 재즈의 대모 박성연을 추모한 ‘클럽 야누스와 친구들’ 공연은 재즈에 대한 이해가 동반된 좋은 기획이었다.

트라이보울 재즈페스티벌 렉처콘서트 공연 모습 – 러쉬라이프 ©트라이보울

트라이보울 재즈페스티벌 렉처콘서트 공연 모습 – 올블루스 ©트라이보울
올해 가장 눈에 띈 기획은 재즈평론가 황덕호가 진행한 렉처 콘서트였다. 황덕호는 ‘재즈를 찾아서 – 재즈는 어떤 음악인가’, ‘재즈의 역사 – 재즈는 어떻게 변모해왔나’란 주제의 토크 콘서트를 준비했다. 두 차례의 강연을 위해 ‘올블루스’와 ‘러쉬 라이프’ 두 밴드가 황덕호와 함께 무대에 섰다. 주제처럼 황덕호는 재즈를 중심에 두고 재즈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말로 풀었다. 그 설명을 음악으로 표현해 준 건 재즈 연주자들이었다.
황덕호의 강연을 기대하고 갔다가 올블루스의 연주에 흠뻑 매료돼 돌아온 공연이었다. 토크와 음악이 이상적으로 결합한 렉처 콘서트였다. 올블루스는 황덕호가 설명한 재즈, 블루스, 래그타임, 가스펠, 소울 등 다양한 ‘흑인 음악’을 멋진 연주로 풀어주었다. 안내문에 쓰여 있는 “재즈뿐만 아니라 블루스, 가스펠, 소울 뮤직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베테랑 연주자들로 구성된 올스타 밴드”란 설명에 완벽하게 부합했다. 민요 ‘When The Saint Go Marching In’이나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등은 대중에게도 친숙하면서도 각 장르를 설명하기엔 맞춤한 선곡이었다.

트라이보울 재즈페스티벌 야외공연 모습 – 원포올빅밴드 ©트라이보울

트라이보울 재즈페스티벌 야외공연 모습 – 김유진퀸텟 ©트라이보울
황덕호의 강연과 올블루스의 연주가 끝난 뒤 어두운 트라이보울 공연장에서 나오자 근처 푸른 잔디밭에선 또 다른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트롬보니스트 최수진이 이끄는 원포올 빅밴드의 공연이 펼쳐졌다. 최수진은 트롬본을 연주하는 연주자이면서 『재즈로 숨을 쉽니다』란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다. 공연명 ‘재즈로 숨을 쉽니다’는 책 제목에서 따온 것이었다. 한국에서 빅밴드 연주를 보는 건 흔하지 않은 데다, 일정 수준 이상의 빅밴드 공연을 보는 건 더 쉽지 않다. ‘트라이보울 초이스’로 선정된 최수진 & 원포올 빅밴드의 공연은 트라이보울이 선택한 재즈의 미래이면서 동시에 다양성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어진 김유진 퀸텟 공연은 재즈에 대한 주최 측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김유진이란 재즈 음악인을 아는 대중은 얼마나 될까? 하지만 지금 김유진이 얼마나 유망하고 가능성 높은 신인인지는 재즈 신(scene) 전체가 알고 있다. 김유진은 2022년 첫 앨범 「한 조각 그리고 전체」를 발표하며 많은 재즈 관계자의 관심을 모았다. 모든 곡을 직접 만들어 앨범에 담았고, 각기 다른 스타일과 편성으로 스탠더드가 아닌 김유진의 음악을 담았다. 이 당찬 신인과 관록의 베테랑 웅산의 공연을 연이어 배치한 건 <트라이보울 재즈 페스티벌>의 의도였고, 이는 한국 재즈의 현재와 미래를 비교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 이어졌다.
공연에서도 김유진은 익숙한 스탠더드 대신 자신의 곡을 들려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곡들의 편곡이나 무드는 공간의 분위기나 공기와 잘 어울렸다. 웅산 공연은 익숙한 것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었다. 열정과 달콤함이 함께했다. 웅산은 활동 초기 「Blues」(2005)와 「Yesterday」(2007)를 연이어 발표하며 탁월한 싱어이며 동시에 훌륭한 송라이터로도 주목받았다. 최근엔 스탠더드를 비롯한 기존 곡들을 커버하는 빈도가 늘었지만, 지난해 발표한 「Who Stole The Skies」의 사례처럼 여전히 창작자로서의 면모도 놓치지 않고 있다. 재즈가 과거의 곡만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음악을 계속 창작하고 있다는 것을 김유진과 웅산은 앨범을 통해, 또 늦여름의 송도 무대에서 입증해 보였다.
장르의 다양성, 재즈가 갖는 전문성, 그러면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성까지 모두 보여준 공연이었다. 딱 하나 아쉬운 점을 꼽자면 늦여름이라는 계절과 연관된 것이다. 완전히 더위가 가시진 않았고, 한낮의 해는 여전히 뜨거웠다. 모든 공연 프로그램이 대략 2시간 정도만 늦춰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낮의 무대는 분명 집중이 어렵다. 가령 최수진 & 원포올 빅밴드의 공연은 공연의 질과는 무관하게 어수선한 분위기가 다소 아쉬웠다. 좋은 야외 공연은 음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장소와 시기가 주는 특별함이 분명히 있다. 여전히 뜨겁던 해는 그래서 야속했다. 좋은 공연의 기억을 안고 돌아왔지만, 관악기 소리가 해 질 녘에 울려 퍼졌다면 더 오래 기억에 남았을 것이다.

김학선 (金學宣, Kim Hak Seon)
2000년 인터넷음악방송국 <쌈넷> 기자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 EBS <스페이스 공감> 기획위원, 멜로 <트랙제로> 전문위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밖에 여러 온라인·오프라인 매체에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있다. <K·POP 세계를 홀리다>를 썼고, <한국 팝의 고고학>, <멜로우 시티, 멜로우 팝>을 함께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