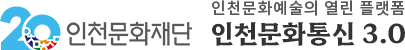> 리뷰
디아스포라, 또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대한 단상, 또는 잡담
안시환 (영화평론가)
01. ‘사이 내 공간’에 선 디아스포라
2022년 지금, 여기의 디아스포라가 자리한(할) 곳은 어디인가? 호미 바바(Homi K. Bhabha)는 <문화의 위치>에서 주인과 노예, 자아와 타자, 자국문화와 타국문화 간의 이분법적 구분이 사라진 ‘제3의 영역’으로서 ‘사이 내 공간’(in-between space)을 이야기한다. ‘사이 내 공간’을 사유한다는 것은 인종적, 민족적 순수성에 기초한 견고하게 고정된 (민족)문화의 불가능성을 상정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지금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는 이것과 저것이 어지럽게 뒤섞인 혼종의 영역, 달리 말해 본래적인 것이 혼탁해지고 지워져 기원의 흔적을 알아채기 어려운 ‘사이 내 공간’에서 바라보기를, 또는 그 위치를 향해 시선을 던지기를 요구한다. 민족적, 인종적 배타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탐색,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의 디아스포라를 사유해야 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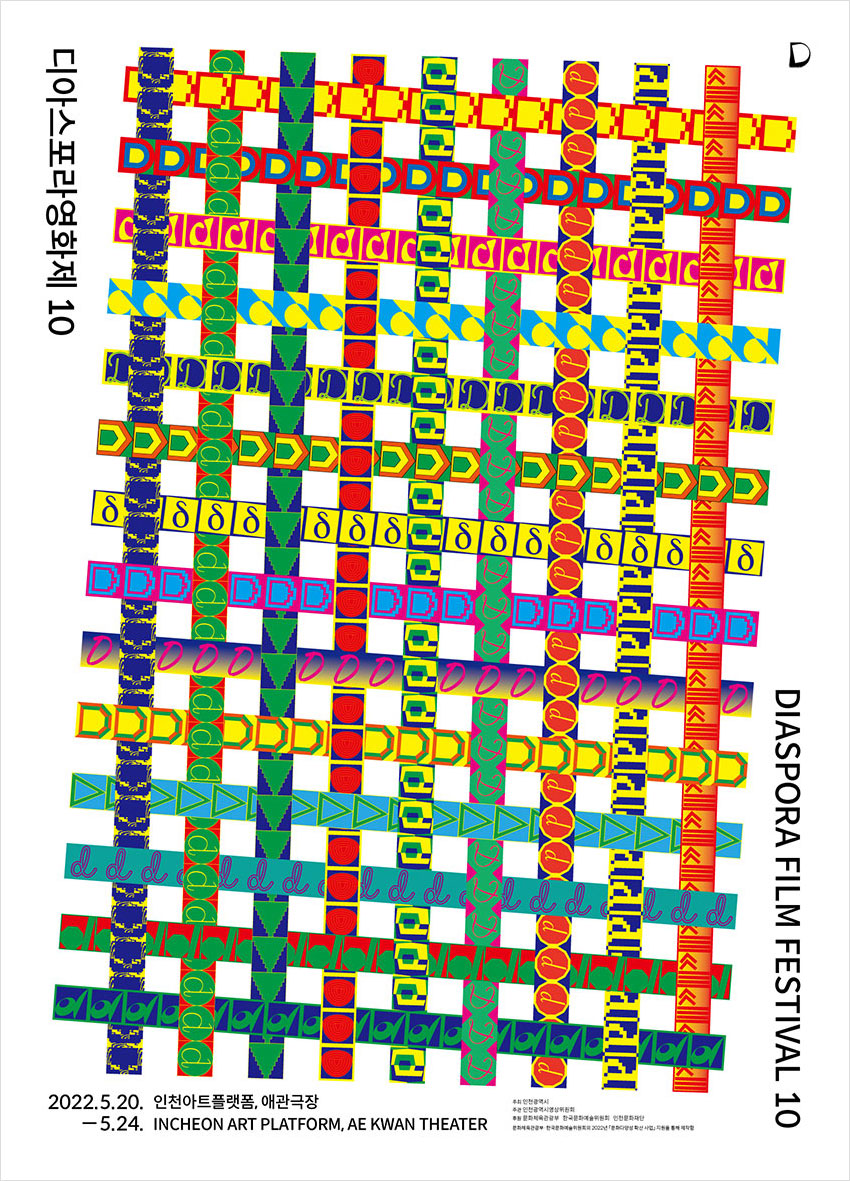
제10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공식 포스터
(출처: 디아스포라 영화제 홈페이지)




제10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현장 모습
(사진제공: 인천영상위원회)
02.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딜레마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동한 일련의 영화제(예를 들면 부산국제영화나 전주국제영화제 등)와 달리, 2010년을 전후로 시작된 영화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주제(또는 소재)를 내세운다. ‘건축영화제’, ‘음식영화제’, 그리고 ‘디아스포라 영화제’ 등처럼 말이다. 건축영화제를 한국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사)환경재단이 주최하듯,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아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무지개다리 사업’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이들 영화제는 ‘영화’보다는 영화제의 성격을 한정하는 ‘주제어’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 영화제에서 영화는 한 편으로 (영화제라는 성격상) 목적으로 자리하면서도,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주제어에 종속되거나 봉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사이 내 공간’으로서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딜레마.
2022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네마 피크닉’을 보라. <카사블랑카>(마이클 커티즈, 1942), <사운드 오브 뮤직>(로버트 와이즈, 1965) 등의 할리우드 고전 영화에서부터 <바그다드 카페: 디렉터스 컷>(퍼시 애들론, 1987),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아키 카우리스마키, 1989), <첨밀밀>(진가신, 1997),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소피아 코폴라, 2003) 등의 작품으로 구성된 시네마 피크닉의 작품들은 일반적 의미의 디아스포라 영화가 아니다. ‘시네마 피크닉’에서 뿐만 아니라, <스파이의 아내>(구로사와 기요시, 2020), <드라이브 마이 카>(하마구치 류스케, 2021) <퍼스트 카우>(켈리 라이카트, 2019) 등처럼 ‘디아스포라 장편’ 부문에도 이러한 유형의 영화가 다수 포진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 영화가 디아스포라 영화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프레임’으로 이들 영화를 바라보자는 영화제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령, 디아스포라의 프레임으로 바라봤을 때, 이방인의 눈에 비친, 차장 위로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도쿄의 이미지(<사랑도 리콜이 되나요?>)와 아메리칸 드림의 황량한 풍경(<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은 어떻게 변주, 확장되는가, 라는 질문. 디아스포라를 고정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사이 내 공간’에서 어제의 것과 오늘의 것, 그리고 오늘의 것과 내일의 것이 다투고 협상하여 끊없이 변주되는 생성의 장소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러한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시도를 기꺼이 환대해야 한다.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영화를 범위를 한계 짓는 것이 아니라, 영화와 디아스프라를 서로 마주 보게 하는 것, 그럼으로써 두 이질적 대상이 미처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각자의 영역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제어를 수식어로 내건 영화제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제10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현장 모습 (사진제공 : 인천영상위원회)
03. 다시 그 장소의 디아스포라 영화제
내 기억이 맞다면 2013년 첫 번째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개최 장소는 인천 동인천에 위치한 ‘아트플랫폼’ 인근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영화공간 주안’과 복합쇼핑몰 스퀘어원에 위치한 ‘CGV 연수’를 거쳐 2022년에 다시 ‘그 장소’로 되돌아왔다.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모든 이주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자발적이었다 해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강요된 자유이고, 생존을 위한 강제된 선택이다. 비약하자면,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지난 몇 년간 강제된 이주를 경험한 끝에 다시 기원의 장소로 귀환했다. 이 귀환은 어쩔 수 없이 또 하나의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안과 바깥으로 들고 나는 이주가 벌어졌던 ‘사이 내 공간’인 그곳과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 그러니까 장소가 영화제의 병풍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는 영화제는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해답 없는 질문.
떠난 자와 들어온 자, 이주의 드나듦이 벌어졌던 그곳은, 1902년 12월 22일, 하와이를 향한 첫 번째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장소이자, 또한 한국으로 이주해 사회적 타자로 살아야 했던 화교의 근거지이며, 식민시대의 가해자로 이주해온 이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것이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 세션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의 경험을 주제로 한 ‘다른 나라에서’로 정한 이유일 것이다(이 세션은 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 특별 기획이기도 하다). 떠난 자들과 떠나온 자들의 흔적이 중첩된 그 곳에서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장소성을 영화제 프로그램의 일부로 삼투한 것이다. 어쩌면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역할은 분명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들, 정착민의 이야기에 묻혀 들리지 않는 이주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일이다. 그렇기에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이주의 상황에 처한 이들뿐만 아니라, 주류의 정체성에 억눌린 비주류의 소수자들에게 보내는 환대의 손길이기도 하다. 양영희 감독의 <수프의 이데올로기>에서 한국인 딸과 장모의 요리였던 닭백숙을 일본인 사위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는 행위처럼, 환대는 ‘사이 내 공간’에서 상처받은 이들의 고통받는 얼굴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렇기에 디아스포포라 영화제는 고통을 위무하는 씻김굿이다. 굿판은 사연이 깃든 장소에서 벌어져야 하는 법이다.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귀환을 환영한다.

안시환
아주 가끔 영화에 관해 글을 쓰는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