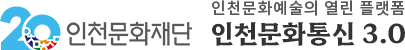> 리뷰
고생 끝에 락이 온다
<2024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김학선
2009년은 인천에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시작한 이래 가장 위기였던 해였을 것이다. 경기도 이천에서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모든 관심은 지산으로 쏠렸다(공식적인 외래어 표기로는 ‘록’이 맞지만, 각 페스티벌의 자체 표기법에 따라 글을 썼다). 그동안 ‘록 페스티벌’의 대명사처럼 인식됐던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상대적으로 초라해졌다. 라인업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았다. 조롱까지도 따를 정도였다. 몇 년간 하락세는 지속됐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서 2012년 지산에서 라디오헤드(Radiohead)를 섭외하고 ‘역대 최다’ 관객을 자랑할 때 펜타포트의 위상은 더 낮아졌다.
지금의 위상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얻은 것이다.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음악 축제가 새롭게 개최됐지만,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웠다. ‘살아남는’ 게 얼마나 큰 미덕인지를 펜타포트가 증명해냈다. 수많은 부침을 겪은 뒤에 펜타포트는 전국의 많은 음악 페스티벌 가운데 ‘맏형’ 같은 존재가 됐다. 오랜 역사뿐 아니라 한여름이라는 계절의 상징성과 록 페스티벌 특유의 에너지와 열기가 더해져 만들어낸, 페스티벌의 정수 같은 이미지가 생겨난 것이다.
올해 3일간 펜타포트가 열린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을 찾은 15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는 그 상징성을 증명하는 숫자였다. 더불어 펜타포트가 완벽하게 부활했으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했다. 여전히 음악 페스티벌에서 ‘라인업’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인 시대는 아니다. 2012년의 지산처럼 라디오헤드 같은 슈퍼스타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다면 분명 유의미한 관객의 증가가 있겠지만, 꼭 화려한 라인업이 아니더라도 축제를 찾고 경험하고 즐기는 새로운 관객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4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인천광역시

관객들의 서클핏
©인천광역시
2024년의 펜타포트가 바로 그랬다. 언제부턴가 음악 페스티벌은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러 가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음악과 현장을 즐기는 ‘경험’이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이제는 페스티벌 앞에 ‘락’을 떼고 ‘뮤직’을 번갈아 사용할 만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이 무대에 선다. 더 이상 ‘록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시대가 된 것이다. 모싱과 써클핏이 난무하는 무대 앞 현장과 멀찍이 돗자리를 펴고 즐기는 여유의 공존이야말로 지금의 축제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올해 펜타포트의 출연진도 공존의 좋은 사례였다. 활동 40주년과 함께 고별 투어를 돌고 있는 극단적인 헤비 사운드를 들려주는 브라질의 헤비메탈 밴드 세풀투라(Sepultura)와 아이돌 밴드로 시작해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대세 밴드가 된 데이식스(Day6)가 같은 날 무대에 섰다. 많은 논란을 낳았던 인플루언서 밴드 QWER과 루저 정서를 지닌 슈게이즈 사운드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1인 밴드 파란노을은 정서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다. 너무나 영국적인 라이드(Ride)와 너무나 미국적인 잭 화이트(Jack White)의 각기 다른 무대를 연이어 보는 것은 흥미로우면서 즐거웠다.
3일간 모인 15만 명의 관객은 이 모두를 편견 없이 즐겼다. 자신이 잘 모르는 음악이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음악의 장점을 찾아냈다. 둘째 날인 8월 3일 축제의 주인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열띤 호응을 얻은 블랙 메탈 밴드 다크 미러 오브 트레저디(Dark Mirror Ov Tragedy, 이하 DMOT)의 공연이 대표적이었다. ‘시체 화장’이라 부를 만큼 짙은 메이크업을 한 채 광폭하면서 아름답기까지 한 음악을 들려준 DMOT는 마치 하나의 극처럼 공연을 진행했다. 중요한 것은 그날 모인 수만 명의 관객 가운데 이전까지 블랙 메탈을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관객들은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의상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낯선 음악에 젖어 들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축제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었다.

다크 미러 오브 트레저디
©인천광역시

데이식스
©인천광역시
사흘간 쉼 없이 이어진 공연 가운데 수많은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지만, 첫날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른 턴스타일(Turnstile)은 한국 페스티벌 역사에 남을 무대를 연출했다. 대중적인 하드코어 펑크 밴드로 평소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해온 턴스타일은 자신들의 무대에 관객을 올라오게 했다. 이는 턴스타일의 공연에서 늘 있어온 퍼포먼스였지만, 그 커다란 무대에 올라온 수많은 관객의 모습은 마치 록의 해방구를 연상케 했다. ‘라이브’에서만 연출할 수 있는 장관이었다. 이 파격적인 이벤트를 이어 3일 동안 계속해서 음악의 순간이 펼쳐졌다. 그 음악의 순간에 장르를 따지는 해묵은 논쟁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과거 위기일 때 펜타포트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다. 해외 주요 출연진을 지산에게 모두 빼앗기던 때 펜타포트가 택한 아티스트는 비교적 쉽게 데려올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음악가들이었다. 궁여지책에 가까웠지만, 이는 펜타포트만의 색깔이 될 수도 있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아시아 음악의 연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선택이 됐다. 음악의 국경에도, 국적에도 편견은 사라졌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음악 취향은 점차 개인화되고 파편화됐지만 폭은 더 넓어졌다. 그 넓어진 폭에는 아시아권의 음악도 포함돼 있었다. 펜타포트의 긴 역사에서 이런 변화를 엿볼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펜타포트가 끝나고 연이어 기사가 쏟아졌다. 3일 동안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을 찾은 15만이라는 숫자가 가장 크게 부각됐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가치 있던 건, 각각의 음악이 모두 존중받았다는 것이다. 미국 인디 록의 전설적 존재인 킴 고든(Kim Gordon)의 무대는 난해하게 들릴 여지가 많았다. 하지만 70대의 킴 고든이 전성기를 보낸 시절 태어나지도 않은 젊은이들은 그 음악에 집중했다. 매해 축제의 출연진이 공개되면 수많은 논쟁이 벌어진다. 현장에서 공연을 보고 있으면 인터넷 안의 세상이 얼마나 좁고 편협한지를 실감하게 된다. 킴 고든과 DMOT와 QWER의 공연이 열리는 실제 현장에서는 편견도, 논쟁도, 세대도 존재하지 않았다. 연대와 열정만이 가득했다.

김학선(金學宣, KIM HAK SEON)
대중음악평론가. EBS 스페이스 공감 기획위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멜론 트랙제로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밖에 여러 온라인·오프라인 매체에서 글쓰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