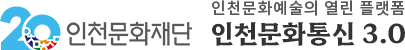2024년 3월 30일에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 ©박석태
지난 주말 토요일 꽃샘추위를 뚫고 숭의아레나(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애칭)로 향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째 홈경기 ‘직관’이었습니다. 새로 산 올 시즌 유니폼을 꺼내어 입고 인천유나이티드(이하 ‘인유’)가 새겨진 머플러도 목에 살뜰하게 둘렀지요. 언제나 3월의 축구장은 차디찬 바람으로 가득하지만, 팬들의 새 시즌에 대한 기대와 열기는 그것을 압도합니다.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기원한다는 건 열정의 다른 이름이기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20년을 꾸준히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저에게는 그 어떤 것 못지않게 좋아하는 대상이 축구, 그것도 K리그, 그중에서도 인유입니다. 저에게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월드컵보다 매주 열리는 K리그가 훨씬 소중하고 흥미롭습니다. 저에게 인유는 다름 아닌 ‘우리 동네 팀’이고, 매주 열리는 K리그는 ‘우리들의 월드컵’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경기장은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길목에 있으니, 좋아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국가대표 하나 없는 가난한 시민구단이지만, 우리 팬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금쪽같은’ 선수고, 팀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2003년 12월 12일 창단했습니다. 작년에 창단 20주년을 맞았죠. 당시 제 주위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도 프로축구팀이 생긴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들떴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한 시점은 2005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이때 처음으로 축구장(당시는 문학경기장)을 갔고, 서포팅을 접했죠. 심장 박동을 닮은 북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던 그때의 두근거림은 이후 저를 인유 팬으로 살게 했습니다. 내내 잊고 지내던 뜨거운 야성을 되찾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인유 선수들에게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는 ‘파랑검정’ 서포터즈 ©박석태
2005년, 인천이 리그 2위를 차지했던 해였습니다. 독일의 로란트 감독이 사임하고 장외룡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때 임중용이 주장을 맡았고(그는 이번 시즌 인천유나이티드의 단장이 되었습니다), 최효진, 서동원, 라돈치치가 활약했었죠. 당시는 야구처럼 시즌 맨 마지막에 ‘챔피언 결정전’을 치렀는데, 울산과의 경기에서 처참하게 패배해 무척 가슴 아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때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비상>을 세 번 정도 본 것 같네요. 이후 지금까지 틈만 나면 경기장으로 향하니, 저는 인천과 청춘을 함께 보낸 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천의 응원가 중 <인천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서쪽 끝 도시의 사람들, 세상은 거칠다 말하지. 하지만 최고의 석양과 낭만과 꿈들을 가졌다네.” 사람에게는 거친 구석도 있고 유순한 면도 있습니다. 그 둘은 상보적 관계라는 생각입니다. 거친 면이 있어야 그가 가진 낭만이 더욱 돋보이겠죠. 인천 사람들에게 그런 매력이 있다면, 이 노래는 그 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지 않을까요.

숭의아레나 서쪽 벽에 걸린 <인천 사람들> 가사 (2020년 8월 27일 촬영) ©박석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올 시즌 인유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팬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리그의 상위 스플릿 진출이나 ACL(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 아시아 무대를 호령했으면 하는 바람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인천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만의 색깔’이란 뭘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유는 슈퍼스타급의 선수를 보유한 팀이 아닙니다. 축구에 관심이 비교적 적은 분들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선수들이 대다수입니다. 흥미로우면서도 자랑스러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2부 리그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유는 언제나 강등 후보 1순위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그야말로 젖 먹던 힘까지 다해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해 왔습니다.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민구단은 말할 것도 없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기업 구단들도 한 번쯤은 쓰린 경험을 했으니까요.

경기 후에는 선수들이 성원을 보낸 관중에게 일일이 인사한다. 경기장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2020년 8월 27일 FC서울과의 경기 후) ©박석태
이 기적 같은 일이 있기까지의 공은 당연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의 몫이겠지만, 90분 풀타임이 지나도 목이 터져라 응원한 팬들에게 돌릴 일이기도 합니다. 잔류가 결정되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던 모습은 모든 축구팬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죠. 인유만큼 구단과 팬의 일체감이 형성된 팀을 찾기 어렵습니다. 팬을 위한 축구, 그런 축구에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팬. 그것이 인유입니다. 그런 모습은 이제 ‘인천만의 색깔’로 인식되었고, 마침내 가장 열정적인 서포터즈를 보유한 팀이라는 인식이 K리그 팬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인유의 축구는 화려하지 않지만 우직하고 단단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른 선수를 위해 한 발짝 더 뜁니다. 저는 그런 인유의 플레이를 보며 인천을 떠올리고, 인생을 배웁니다. 투박하지만 정감 있고, 무뚝뚝하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속 깊은 우리네를 봅니다. 비록 주목받는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평범한 선수들의 성실한 플레이는 감동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칠다고 말하는 서쪽 끝 도시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천만의 색깔’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습을 닮은 인유의 경기를 보는 일은 그래서 언제나 즐겁습니다. 화사한 봄꽃이 만발할 주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도원역 앞 숭의아레나로 향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 인천을 위한, 우리를 위한 노래를 목 놓아 부를 일입니다. 봄은 그렇게 옵니다.

박석태(朴奭泰 / Park Seok Tae)
인천문화재단 전략기획팀 근무.
인천 근현대미술사 연구와 강의를 겸하고 있다. 인천유나이티드의 20년 차 팬으로 주말이면 숭의아레나로 향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