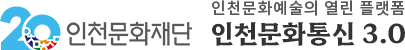> 리뷰
사진이 된 소설
윤정미 사진전 <사진으로 읽는 인천 근현대 소설>
이재은
소설을 읽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 “누구나 자기 자신,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궁금해하잖아요. 이야기는 우리를 낯설고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나’를 들여다보게 해요.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알게 되는데 캄캄한 무덤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진귀함을 캐낸 듯한 기쁨이 있어요.
예술가의 모든 작업은 사랑에서 시작한다. 섬을 사랑하는 사람은 섬을, 길을 사랑하는 사람은 길을, 새를 사랑하는 사람은 새를 쓰고, 그리고, 노래한다. 윤정미 작가는 인천과 인천이 무대가 된 소설을 사랑했다. 2008년경, 학창 시절에 접한 근대소설을 재독하고 인간이나 사회에 내재한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시리즈를 시작했다. 2016년 <앵글에 담긴 근현대 한국문학>에 이어 이번 <사진으로 읽는 인천 근현대 소설> 전에서 작가는 열다섯 편의 소설 속 인천을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진으로 펼쳐냈다. 텍스트가 먼저 인천을 품고, 다시 이미지로 재현한 장르적 융합이자 예술적 사건이다.

전시장 입구Ⓒ이재은
1907년 이해조의 개화기 소설부터 이광수, 김말봉, 한용운 작품과 더불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8),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1979), 김중미의 『모두 깜언』(2015)까지. 윤정미는 소설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뽑고, 장소와 배우를 찾고, 소품과 의상을 구하고, 구도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오롯이 해냈다. 글자 언어가 익숙한 나는 글이 아닌 다른 매체로 서사를 표현한 결과물을 보는 것이 마냥 신기하고 즐거웠는데 작가도 “평소와는 다른 이질적이면서 즐거운 과정이었다”고 한다.


(왼쪽부터) 1층 전시장, 2층 전시장Ⓒ이재은
소설가는 이야기를 짓고, 사진가는 이야기의 한 장면을 뽑아 이미지로 만들고, 어떤 소설가(=나)는 그 이미지에서 기어코 자신을 찾는다. 반듯하고 말쑥한 사진 앞에서 나는 원작에 없는 문장을 끄적였다. 윤정미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앞에서 떠올린 생각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윤정미
벼랑 끝에는 낙원이 없지만 거기 가족이 있다.”
“생이 부끄러우면 마주 보는 걸 피하게 된다. 때로 정면보다 측면이 편하지만 꼿꼿이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 글을 쓰기 전에 잠깐, 이원규 조세희 오정희의 소설 일부를 옮겨볼까 하는 마음을 먹었다. 아직 작품을 읽지 않은 독자와 관람객에게 친절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차차, 그럼 안 되지. 사진가의 ‘자기표현’을 내가 ‘증명’하는 꼴이 될지도 몰라. 이야기를 모르면 어때. 사진만 보고도 얼마든지 다른 세계로 빠져들 수 있는데.
내 키보다 높은 사진 아래서, 내 품보다 넓은 너비 앞에서, 1초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을 수는 없었다. 나는 올려다봤다. 들여다봤다. 경이로움을 느끼고 빠져들었다. 조금 전 내가 만든 문장은 결국 또 다른 ‘나’가 아닌가. 역시 예술은 발견이고, 창조고, 전파야.



(왼쪽부터) <중국인 거리>, <포구의 황혼>, <바닷가 소년>Ⓒ윤정미
“푸른 새벽의 끔찍한 죽음. 지옥과 혼돈. 가련한 무명.”
“원한다면 시인이 되세요. 죄를 저지른 뒤 웃지 않고, 공범과 눈을 마주치고,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속을 게우고 드러내는 무시무시한 거인이 되세요.”
“자기 몫으로 산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거저 받아 엄청나게 큰 스웨터를 입고 생각에 잠겨있는 소년.”
사슴이 떠올랐다.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 떠올랐다. 무지개색 꽃으로 꾸민 목관이 떠올랐다. 기원전 오천 년 전에 만든 왕의 무덤에 새겨진 상형문자가 떠올랐다. 무슨 의식의 흐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서 좋았다. 상상도 이상도 내 멋대로 할 수 있지. 후후.
얼마 전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섬찟하다는 단어를 보았고, 한참 눈을 떼지 못했다. 섬찟? 이런 말도 있었나? 찟? 찟? 잠시 숨죽인 뒤 섬뜩하다와 비슷한 말일 거라고 짐작했다. 그러고 보니 알고 있던 어휘 같기도 했다. 의미를 알기 전의 문자나 의미를 갖지 못한 음소는 그게 ‘내가 잘 아는 한글’이어도 다소 기이해 보인다. 전시장 2층에 누워 있는 죽은 여자들은 소름 끼치도록 끔찍했지만 작가로서, 여성으로서, 이걸 놓칠 수는 없었겠구나 싶어서 마구 응원하고 싶어졌다.
꼭 보러 가야 할까? 간단한 인터넷 서핑으로 앉은 자리에서 사진을 구경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지! 그건 ‘목도’가 선사하는 예술의 경외와 감탄 앞에서 뒷걸음질치는 행위와 같다. 고즈넉한 관찰. ‘나’를 보려고 온 것을 알면 거기 경이롭게 걸린 사진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줄지도 모른다. 너는 누구니?
시간이 허락한다면 걸어서 그곳의 문을 열자. 입구에 서서 전시소개를 읽고 동선을 파악하고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고 그렇게 머물다 숨겨보다 기다리다, 근처 어딘가에서 한잔하고 돌아와도 좋겠지. 찰칵, 관람 인증샷으로 끝내지 않고 기어이 열다섯 편의 소설 중 하나를 골라 윤정미가 펼쳐낸 세계와 나란히 두고 예술가의 언어에 희미하게 밑줄 긋고 별을 달아도 괜찮겠지.

이재은 (李在恩/Lee Jae Eun)
소설가. 2015년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23회 심훈문학상을 수상했다. 소설집 『비 인터뷰』, 『1인가구 특별동거법』 등이 있다.
1인문화예술공간 마음만만연구소 운영.